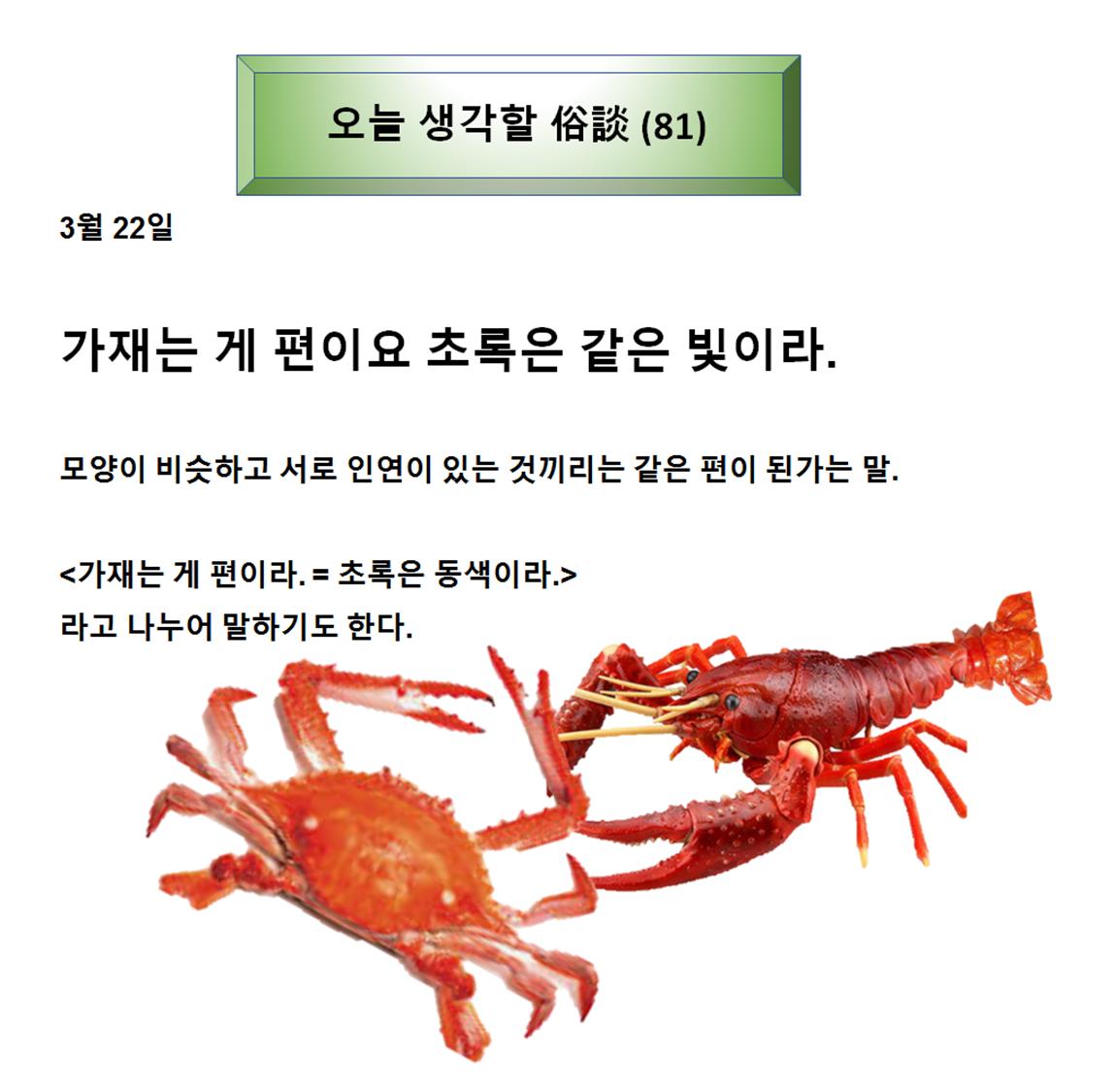요양원 거실의 식탁, 그 위로 점심을 기다리는 두 할머니의 대화가 잔잔히 흐른다. “집에 감나무 있어?” 경상도 억양이 싹싹하고 경쾌하다. “어~ 있쪄, 세 그루여~. 다 먹도 못혀. 실컷 먹고도 남아. 동네 다 노나주지.” 충청도 사투리는 느릿느릿, 그러나 단단하다. 두 분의 대화는 짧지만 깊다. 지금은 서로 다른 방에 배정된 두 분이지만, 한때는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였다. 그러나 그 기억은 이미 흐릿해져 있다. 대신 남은 것은 옛집의 감나무, 그곳에서 보내던 날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짧은 대화 속에 두 할머니의 삶이 스며 있다. 감나무는 단순한 과실나무가 아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이 살아온 일상의 축적이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풍성했던 날들의 상징이다. 경상도와 충청도의 억양이 교차하며 나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