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로운 체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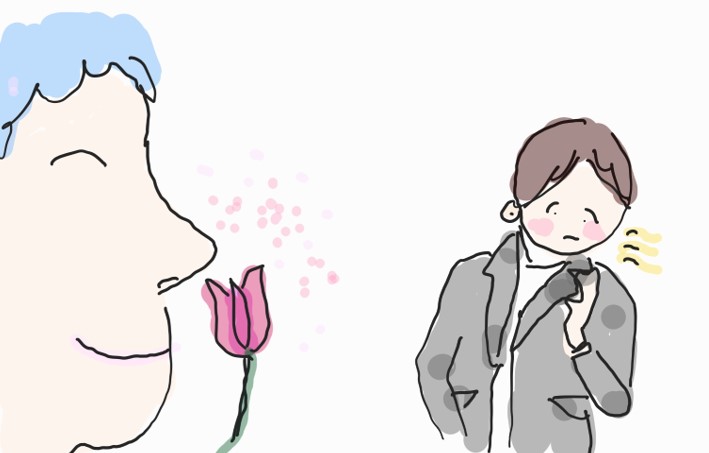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므로 어디까지가 참말인지 모르지만, 인간은 대개의 냄새에 익숙해진다고 한다. 꽤나 지독한 냄새라도 얼마 동안 맡고 있노라면 언젠가는 익숙해져버리는 모양이다. 실제로 냄새 그 자체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묽어지는 수도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도 있는 것 같다. 이것 또한 들은 이야기인데 정로환의 냄새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들은 일이 있다. 이것은 어쩌면 익숙해지고 아니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로환 자체가 풍기는 냄새가 언제까지 시간이 지나도 묽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시험해보려고 생각해 본 일은 없다. 누가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꼭 시험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었으면 좋겠다.
민족에 따라 음식물에 독특한 향료를 넣어서 특이한 냄새를 풍기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경우는 김치 냄새, 고추장 냄새, 젓갈 냄새, 청국장 끓이는 냄새가 특색이 있다. 그런데 대체로 한국 음식에 쓰이는 조미료 중에 특히 마늘 냄새가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에게서는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여 경멸시하고 혐오하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 한국의 김치의 독특한 맛에 길들어져서 그러한 것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나 근래에는 마늘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에 가서 식당에 들어가면 풍겨 나오는 특이한 향료 냄새가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역겨워 음식물을 먹기가 곤란할 정도이다. 그래서 중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한국 특유의 냄새를 지닌 고추장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중국에서 살면서 자주 먹게 되면 익숙해져서 역겨움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익숙해지려고 하여도 익숙해질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냄새일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서도 나는 냄새일터인데 남의 몸에서 나는 냄새라면 그것이 그렇게도 역겨운 것은 무슨 때문일까?
특히 젊은 사람의 발에서 나는 발 냄새는 접할 때마다 역겨운 것이며 무감각하게 있을 수가 없다.
겨드랑이에서 시큼하면서 톡 쏘는 듯한 독특한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다. 소위 암내라는 것이다. 본인 자신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의 곁을 지나가기만 해도 대개의 사람은 역겨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암내가 나는 특이한 체질을 가진 사람과 부부가 되어서 사는 사람에게는 전혀 느낄 수 없다고 하니 그것이야말로 찰떡궁합이라 하겠다.
그뿐인가? 술을 마시고 이튿날 아침, 술이 다 깨어갈 무렵 풍기는 술 냄새는 남에게 역겨움을 준다. 소화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의 방귀 냄새, 이런 것은 사람이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 터이지만 체내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화학 작용을 거치며 생겨난 것일 것이며 대개의 사람은 역겨움을 느낄 것이다.
옛날부터 이러한 몸에서 나는 냄새를 희석시키거나 없애기 위하여 향수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향수의 기원을 따져보면 이 향수라는 것은 원래 먼 옛날 날마다 목욕을 할 수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이 체취를 감추기 위하여 생각해 낸 것이라고도 하고. 종교적 의식에서 생겨났다고도 한다. 곧 신을 신성하게 여겨온 고대의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몸을 청결히 하고, 향기가 풍기는 나뭇가지를 태우고, 향나무 잎으로 즙을 내어 몸에 발랐다고 한다. 고대의 향료는 훈향으로서 종교의식에 사용되었고 몸 또는 의복에 부착하는 풍습은 몸의 청정감과 함께 정신미화를 위하여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고사를 지낼 때 먼저 향을 피우는 것이나, 흔히 궂은 일이 일어난 현장을 다녀와서 옷을 벗어 향을 피워 두르는 것들은 이런 옛날의 관습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면 향수는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청정제이며 화장품인 셈이다. 그 후 향수는 이집트 문명권을 거쳐 그리스와 로마 등지로 퍼져 귀족계급의 기호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에 향수가 보급되었다고 하는데, 신라시대의 귀부인들은 향료주머니 곧 향낭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하니 이때 이미 향수는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근대적 의미의 향수가 나온 시기는 1370년경으로서, 헝가리에서 왕비를 위하여 최초로 알코올 향수가 만들어졌다는데, 이 향수를 사용한 왕비는 70세를 넘은 나이에도 언제나 그 향수의 매력으로 폴란드의 왕으로부터 구혼을 받기까지 했다고 한다. 오늘날은 멋있는 젊은 남녀가 좋아해 쓰는 필수품이 되고 있다.
그런데 때로 얼굴을 찡그릴 정도로 향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실은 자신이 쓰는 향수의 냄새에 익숙해져버려서 점점 사용하는 양이 늘기 때문이지만 본인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 잘은 모르겠다.
향수를 쓰는 것은 자신의 몸에서 풍기는 체취를 희석시키고 남에게 냄새로 인한 불쾌감보다 쾌감을 주기 위한 것일 터인데, 향수로 인하여 오히려 남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그 향수를 쓰는 사람이 자신의 향수에 대한 불감증이 심한 때문이 아닐까? 마치 암내 나는 사람이 스스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옛날 당 나라 현종의 총애를 받은 양귀비는 육체파 미인으로서 여름의 더위를 견디지 못하여 매일 옥으로 만든 고기 인형을 번갈아 입에 물고 더위를 식혔다고 하고, 몸에서 흐르는 땀에는 기름기가 있고 향기가 풍겨서 이것을 닦으면 손수건이 분홍빛 물이 들었다고 하며, 땀을 많이 흘려서 시중을 드는 시종들은 하루에 수 십장의 수건을 갈았으나 그 땀이 나는 것만큼 온몸에서 향기가 풍겨 나왔기 때문에 싫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몸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이지만 사료를 연구한 학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과연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풍겨 나오기도 할까? 독특한 체취가 향기로 느껴졌던 것은 아닐까? 몸에서 향기가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을 끌 수 있을 터이니 말이다.
나이가 들어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게을러져서 제때에 목욕을 하지 못하거나, 의복이 정결하지 못하여 또는 병약하여 소화기능이 원만하지 못하거나, 체액을 분비하는 땀샘이라든지 기타 분비의 생리적 기제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때로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한다. 물론 본인 자신은 모르는 냄새이다. 속말로 왕내가 난다고 하여 특히 젊은이에게서 미움을 사는 경우가 있다. 그저 늙기도 서러운데 냄새로 인하여 남들이 싫어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요즘 역겨운 냄새를 지우는 여러 가지 소취제가 있는데, 곧 페이브리즈 같은 것을 뿌리면 의복의 냄새는 지울 수가 있고, 알맞은 향수라도 뿌리는 마음의 깔끔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양귀비처럼 향기가 나는 몸은 아니니 물리적으로 남에게 쾌감을 줄 수는 없더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을 정결히 하며, 고매한 인격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로운 체취 곧 인품 향기를 풍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단상 > 단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추억의 바릇 이야기 (0) | 2021.06.11 |
|---|---|
| 늘그막에 소중해진 야생초 (0) | 2021.05.29 |
| 스승과 제자의 길 (0) | 2021.05.14 |
| 책불환주 (0) | 2021.05.12 |
| 오징어 물 회 집 (0) | 2021.05.09 |